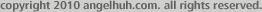《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삶과 그림을 통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했던 두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1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서울 덕수궁미술관(02-779-5310)에서 열리는 ‘한중 대가-장우성(張遇聖·91)·리커란(李可染·1907∼89)’ 전. 새롭고 빠른 것만이 선(善)인 이 시대에 새삼 시간과 역사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다. 두 거장의 대표작들을 인물, 산수(풍경), 화조, 서예 등으로 나눠 작품세계를 비교해 살펴본다.》
○인물화
두 사람은 새로운 기법과 양식으로 새로운 인물화를 창조해 냈다. 장우성은 1920∼30년대 일본풍 미인화를 그릴 때 장식적인 옷 무늬에 치중하느라 사실적인 신체묘사를 무시했던 당시 한국 화단의 주류에서 벗어나 서구적 인체관에 입각해 인물을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또 원색을 사용하는 진채(眞彩)보다는 수묵 담채를 위주로 선의 율조(律調)를 강조함으로써 문인화론에 바탕을 둔 인물화를 창조했다. 그의 대표작 ‘춤’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힘 있는 선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리커란 인물화에서는 필법의 변화가 주목된다. 초기에는 속필, 중기에는 느리지만 강하고 묵직한 선으로 바뀌었다. 인물화 중에서도 중국악기인 호금(胡琴)을 타며 노래 부르는 할머니와 아이를 그린 ‘노래로 돈을 벌다(賣唱圖)’ 같은 작품이 돋보인다.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인물들을 그려 ‘현실에 발을 딛고 선 예술가’의 이상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화조(花鳥) 및 영모(翎毛)
장우성은 화조라는 소재를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분단의 아픔을 까마귀의 울음을 통해 드러낸 ‘절규’나 인간들의 경쟁과 다툼을 까마귀들의 먹이다툼에 비유한 ‘기아쟁식지도(饑鴉爭食之圖)’가 손꼽히는 작품들.
리커란은 평생 소(牛)만 그렸다. 항일 선전화를 그리던 시절인 1939년, 쓰촨(四川)성의 한 농가에 머물 때부터 소를 다뤘다. 그는 어린 목동에게 순종하며 묵묵히 일하는 소를 통해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삶의 여유와 낙천성을 잃지 않는 인민들에 대한 예찬을 표현했다.
○산수(풍경)
장우성은 상상을 그리는 전통산수에서 벗어나 실경(實景)을 그리면서 여기에 ‘심의(心意)’까지 담았다. ‘소나기’ ‘날 저무는 지평선’에서는 먹색의 다양함을 통해 무한한 공간감과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표현했다. 만년의 작품인 ‘야우(夜雨)’는 밤비를 소재로 작가가 느낀 마음의 세계를 강한 용필(用筆)로 구현해 쏟아지는 빗소리까지 들리는 듯하다.
리커란 화백-중국 산수화의 현대화를 선도한 '온 산이 두루 붉다' 사진제공 덕수궁미술관
리커란 회화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산수화다. 그는 산하를 웅장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북송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서양화의 투시도법, 원근법, 음영법을 빌려와 중국 산수화를 현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경(前景)과 후경(後景)의 질서 있고 합리적인 구성, 자연 속에 녹아드는 인간, 대자연을 관조하는 시선, 이 모든 것이 화면 속에 담겨 역동적이고 강렬한 새로운 산수 양식을 이뤄 냈다.
○서예
어려서부터 익힌 한문과 서예를 바탕으로 시서화(詩書畵)를 겸비한 장우성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문인화가’로 평가된다. 리커란은 문화혁명 중 제작 금지를 당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대 비석문을 탐구하면서 서체를 연마했다. 두 사람의 서예작품은 단순한 글씨라기보다 금석파의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한 그들 예술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 27개국 여성이 본 세상…서울여성영화제 4월 6∼14일 | 2006-03-29 |
| 멜로영화 거장 오퓔스 회고전 - 18~26일 서울아트시네마 | 2006-02-16 |
| 韓-中 화단 거장 장우성-리커란 전시회 | 2003-11-14 |
| '상하이 비엔날레' 참관기… 커가는 도시 작아지는 인간 | 2003-01-29 |
| 국화 기품에 반하고 색·향에 취하고 | 199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