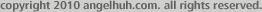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고 사내는 쓸쓸하게 남겨졌다. 퇴근길에 들르는 식당의 여종업원은 그를 짝사랑한다. 어느 날 여종업원은 사내의 옛 애인에게서 ‘전해 달라’며 편지와 함께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는다. 그녀는 남자의 방으로 잠입해 청소를 하고 시트와 식탁보를 갈고 세면도구들을 바꾼다. 남자에게서 옛 애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다. 사내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그의 시간은 애인이 떠난 시점에서 멈춰 버렸다.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重慶森林)’에는 떠난 것에 매여 ‘지금’ 존재하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한 남자가 나온다. 현재를 부유하는 그의 삶은 늘 우울하다.
남자의 삶은 우리에게 ‘기억’이나 ‘과거’라는 묵직한 물음을 던진다. 흔히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각기 다른 시간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과거란 없고 오직 ‘기억’이 있으며 미래는 없고 다만 ‘기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 현재’뿐이다. 우리가 기억(과거)하고 기대(미래)한다고 말하는 온갖 일은 사실은 수많은 현재형 사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이왕주)
기억이란 것의 실체도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전부가 아니라 파편적인 장면이나 사건들이 떠오른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기억이란 게 부끄러움, 죄의식, 미안함, 분노 등의 감정과 함께 저장되므로 ‘진공의 기억’이란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불안정한 기억들이 만들어 내는 과거란 것은 또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
삶은 진공이 아니다. ‘현재’라는 게 무수한 원인과 결과라는 복잡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새겨 본다면, 과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 기준, 처지, 감정의 잣대로 과거의 어느 한 부분만을 골라 해석하고 단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거일 씨의 지적(저서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처럼 ‘과거는 운명’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기억이나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역사라는 집단적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흔히 ‘과거 청산’하면 무조건 ‘선(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과거 청산이란 말에는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진실로 파악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깔려 있다.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또 과거를 감싸 안기보다 무조건 버리고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미움’이 깔려 있다. 그런 과거는 늘, 후회의 대상이다. 대개, 후회는 정신건강에 해롭다.
‘과거 청산’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이 주로 생각이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지식인이나 판사들에게 치중된다는 것도 균형적이지 않다. 더구나 이번에 논란이 된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 판사들의 실명 공개는 왜 법을 어겼느냐는 위법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왜 그때 (악)법에 저항하지 못했느냐’는 양심에 관한 물음이다. 이 모순 덩어리 삶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양심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
제발, 이제는 삶에 대해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삶의 다양한 무늬를 생각하는 인문학적 삶의 태도는 도무지 한국의 정치와는 화합할 수 없는 것인가.
<허문명 교육생활부 차장> angelhuh@donga.com
| 트럼프와 아베의 밀착, 역사 다시 쓰고 있는 미일동맹 | 2019-05-31 |
| 김영철은 왜 경칠됐을까 | 2019-04-29 |
| [광화문에서] ‘과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2007-02-02 |
| [기자의 눈] 가공하고 담합한 기사가 독자에게 통할까 | 2007-01-18 |
| [광화문에서] 증오의 물살을 낮추자 | 2007-01-10 |